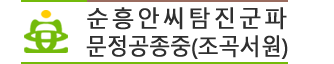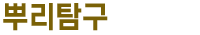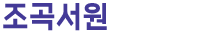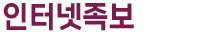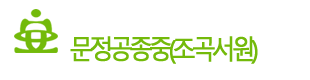◈ 순상 합하께 올린 글(上書于巡相閤下)
자인(慈仁) 유학 안옥(安沃)ㆍ안극(安極)ㆍ안사로(安師魯) 등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백번 절하며 순상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충절을 표창하고 어진 이를 본받게 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의식이고,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제향을 행하는 것은 사림이 어진 이를 존중하고 사모해서 일것입니다. 본현 조곡서원(早谷書院)은 저희들의 선조 추충절의 정난공신(推忠節義靖亂功臣) 평장사(平章事) 오성군(鰲城君) 휘(諱) 우(祐) 및 그의 현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문정공(文靖公) 휘 지(止) 두 선생을 함께 제향하는 장소입니다. 이에 감히 그 사실과 전말을 대략 말씀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합하께서 자세히 살펴 주소서.
무릇 오성군은 고려 말기를 맞아 흉악한 조일신(趙日新)을 주벌하고, 홍건적의 난에 이르러서는 홀로 많은 도적들을 소탕하여 삼한(三韓)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세하였을 때, 포은(圃隱) 정 선생은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명나라 이서애(李西崖)는 시를 지어 그 사실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 및 제강(提綱)과 찬요(纂要) 등의 서책에 뚜렷하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 태조대왕께서는 특별히 숭의전(崇義殿)에 배향하여 복지겸(卜智謙)ㆍ신숭겸(申崇謙) 등의 여러 선생과 함께 같이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셨고, 문양공(文襄公) 양성지(梁誠之)는 조정에 주청하여 문선왕묘(文宣王廟) 의례에 의거하여 무성왕묘(武成王廟)를 건립할 때 공도 함께 봉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문정공은 세종조를 맞아 문형(文衡)을 역임하였는데, 임금께서 조종의 쌓은 왕업을 글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려 공이 마침내〈용비어천가〉를 지어 올렸고, 또 진풍연(進豊宴)에서 임금이 공과 함께 마주하여 춤을 추시고 비단 병풍에 그림으로 그리기를 명령하여 그것을 공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세종실록》에 실려 있으니, 온 동녘땅의 벼슬아치와 유생들 중 누군들 존경하고 사모하여 높이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도의 사림이 순박한 시골 제향의 의미를 담아 한 목소리로 예조에 호소하였는데, 특별히 본 감영에 관사(關辭)를 내려주어 봄과 가을의 향사에 관아의 제수를 봉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 임인년(1842년)에 감사 김영기(金永基) 공이 문충공(文忠公 : 김종직)의 후손으로서 세의를 잊지 않고, 제향을 지낸 뒤에 음복하는 의례를 풍성하게 준비하고자 하여 따로 50꿰미의 돈을 내어 역청(役廳)에 맡겨서 제수를 받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감사 박규현(朴奎賢) 공도 선생의 공적이 걸출함을 앙모하여 저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비록 김 감사가 맡긴 별도의 돈과 같은 것은 없으나, 예조와 감영이 허락한 전(奠)의 뎨김[題音]은 정중할 뿐만이 아니니, 정해진 규례에 따른 관아의 전(奠)을 누가 감히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며, 마침내 이전에 역청에 맡겨 두었던 돈을 찾아내어서 본원(本院 : 조곡서원)에 지급하여 본가의 자손으로 하여금 김 감사의 어진 이를 사모하는 지극한 뜻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관아의 전(奠)을 봉행하는 것이 그대로 정해진 규례가 되었고, 영원히 따라 행하는 통상의 규례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주도 어진 이를 사모하는 정성으로 이전의 규례를 법식대로 준수하며 통상의 전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이미 다섯 차례나 되었습니다.
뜻밖에 올해 가을 향사를 지낸 뒤에 감영의 관속들이 와서 다섯 차례에 걸쳐 관아의 봉전(奉奠)에 썼던 돈을 갑자기 본원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의아함과 당혹감을 이길 수 없어서 바로 본관에게 소장을 올렸는데, 본관의 뎨김[題音] 중에,
“예전(禮典)은 모두 정한 규례가 있으니, 관아가 어찌 식례(式禮)를 어기면서 예전을 보태거나 덜 수 있겠는가. 관속들이 중간에 속이고 감춘 것은 살펴서 바로 잡으면 될 뿐이다. 이번 이 간청은 생각이 부족하여 사체(事體)의 손상을 면치 못할 일이다.”
고 하였습니다. 아! 막중한 공사를 봉행하는 자리에 보잘 것 없는 관속들이 감히 스스로 농간하여 이렇게 관아를 속이고 서원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같이 간사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저속한 습속이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연유를 갖추어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엄격한 관문(關文 : 공문서)을 내리시어, 전례에 따라 영원토록 준수하여 행하며 폐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두 장의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지급해 주셔서, 한 장은 현의 이청(吏廳)에 걸고, 다른 한 장은 본원에 걸어서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해 주시면, 합하의 어진 이를 존중하는 풍습이 영원토록 남쪽의 사인(士人)들에게 찬사로 남을 것이고, 본손의 감사하는 마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천번 만번 지극히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순상 합하 처분.
서기 1853년(계축) 10월 일.
제사(題辭) : 제물을 관아에서 진상하는 것은 애초에 근거할 만 한 정해진 규식이 없으니, 이처럼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초9일 미시(未時).
上書于巡相閤下
慈仁幼學, 安沃安極中安師魯等, 謹齋沐百拜, 上書于巡相閤下. 伏以褒忠象賢, 朝家之盛典, 建祠腏享, 士林之尊慕. 本縣早谷書院, 卽生等先祖, 推忠節義靖亂功臣平章事, 鰲城君, 諱祐, 及其玄孫, 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諡文靖, 諱止, 兩先生幷享之所也. 玆敢略陳其事實顚末, 伏願閤下細垂察焉. 大抵鰲城君, 當麗末, 誅趙日新之凶醜, 逮夫紅巾之亂, 獨掃千軍, 再造三韓. 其沒也, 圃隱鄭先生爲文以祭, 皇明李西崖詩以歌其事. 此皆昭載於東史及提綱纂要等書. 迄我朝, 太祖大王特命配享于崇義殿, 與卜ㆍ申諸先生, 一體同祠, 梁文襄公奏請于朝, 依文宣王廟儀, 立武成王廟, 而公亦與焉. 若我文靖公, 當世宗朝, 歷典文衡, 自上命賦祖宗積累之業, 公乃製進龍飛御天歌, 又於進豊宴, 王與之對舞, 命圖畵于錦屛以賜之. 此乃載在世宗實錄, 則惟我環東土搢紳章甫, 孰不景慕而崇奉乎! 所以一道士林, 以畏壘俎豆之意, 齊聲仰籲於春曺, 特下關辭於本營, 春秋享, 以官祭需奉行者, 厥攸久矣. 粵昔壬寅, 金侯永基, 以文忠公後裔, 不忘世誼, 欲其享儀之豐備, 別出五十縟銅, 以付保役廳, 俾奉祭需矣. 其後朴侯奎賢, 亦仰慕先生實蹟之偉, 招致生等曰: “雖無金侯別付之錢, 春曺及營門之許奠題音, 不啻鄭重, 則依例官奠, 孰敢曰不可.” 遂推出曾付保廳之錢, 以給本院, 使本孫勿忘金侯慕賢之至意. 自其後, 官奠奉行, 仍成已定之例, 以爲永久遵行之常規. 故今城主, 亦以慕賢之誠, 式遵前例, 不廢常典者, 已至五度矣. 不意, 今秋享禮後, 同官屬忽索五度官奠所入之錢於本院. 生等不勝訝惑, 卽呈于本官, 則題音內: “禮典, 皆有定例, 官何嘗違越式例而增減禮典乎! 官屬之中間欺弊, 省察矯捄而已. 今此所訴, 未免小商量, 傷事面.”敎是. 噫! 莫重公奉之地, 幺麽官屬, 敢自弄奸, 有此欺官侵院之弊, 世豈有如許奸頑下習乎! 玆敢緣由仰籲, 伏乞特下嚴關, 依前例, 永久遵行, 勿替之意, 成給完文二丈, 一以揭縣吏廳, 一揭于本院, 永爲惟正之規, 則閤下尊賢之風, 其將永有辭於南土, 而本孫感戴之忱, 亦將無窮期矣. 千萬激切祈恳之至. 巡相閤下 處分.
癸丑 十月 日.
祭物之自官進排, 初無可據之定式, 則不須如是煩訴事.
初九日未時.